
“새우젓 사려,
굴젓도 있슈~우~유.”
젓장수가 젓통 두개를 등에 지고 동네를 돌며 목청을 뽑자 개울 건너 앞산에 산울림이 되어 울려 퍼졌다.
스물두서너집 되는 작은 산골 동네 나지막한 초가집 굴뚝엔 집집마다 저녁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당가 감나무엔 꼭대기에 매달린 몇개 남은 까치밥이 넘어가는 마지막 햇살을 잡고 불을 머금은 듯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추수를 해서 집집마다 곳간이 그득할 때라 조 한됫박을 퍼 와서 새우젓 한국자를 받아가고, 나락 한되를 퍼 와서 굴젓 한종지를 받아 갔다.
새우젓장수 등짐에 젓은 줄었지만 곡식 자루는 늘어 더 힘들어졌다.
새우젓장수는 망설여졌다.
개울 건너 외딴집 하나를 보고 디딤돌을 조심스럽게 밟아 개울을 건너다가 허탕을 치면 어쩌나 싶어 큰소리로 외쳤다.
“새우젓~ 굴젓~. 젓 사려.”
개울 건너 멀리 외딴집 사립문이 열리고 안주인이 나와 손짓을 했다.
장사꾼이 뭔가.
일전만 남아도 십리길을 간다는데 개울 건너 빤히 보이는 곳을 마다할 수야 없지. .
조심조심 디딤돌을 딛고 개울을 건너 갈대밭 오솔길을 지나 외딴집 사립문 앞에 다다랐다.
“젓 왔시유.”
사립문이 열리더니 안주인 여자가 나와 다짜고짜 앙칼진 목소리로,
“여보시오, 말을 좀 똑바로 하고 다니시오. 새우젓, 굴젓 해야지, 새우좆, 굴좆, 좆 사려 하면서, 아니어도 찬바람에 싱숭생숭한 과부 가슴을 흔들어 놓는 거요.”
사립문을 홱 닫고 치마 깃을 걷어 올리며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새우젓장수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 사립짝을 발로 걷어차자 과부가 다시 나왔다.
“내가 젓장수 한 지 십오년이 넘었는데 젓과 좆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오?
내가 좆 사려 좆 사려 했지 언제….”
아뿔싸. 흥분한 나머지 젓장수 입에서 젓과 좆이 헷갈려 버렸다.
과부 왈,
“거봐요. 들어오시오.
그걸 사리다.”
젓지게를 장독대 뒤에 숨겨 두고 젓장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과부가 된장을 보글보글 끓인 저녁상에 탁배기 호리병도 들고 왔다.
탁배기 한사발을 마신 젓장수는 호롱불을 끄고 과부를 쓰러뜨렸다.
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벗기자 벌써 과부는 불덩어리가 되었고 옥문은 질척거렸다.
훌훌 옷을 벗어던진 젓장수가 용솟음치는 양물을 옥문으로 들이밀자 과부는 흐느끼며 낙지처럼 달라붙었다.
구들장이 꺼질 듯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젓장수는 아랫도리만 가리고 저녁상을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해치웠다.
그리고 두번째 운우를 이번엔 길게 길게 하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니 과부가 씨암탉 한마리를 삶아 왔다.
다음 날도 다음날도 계속된 절구질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코피를 쏟았지만 새우젓 파는 것보다 조~엇 장사로 열배 더 돈을 벌어서 돌아왔다.
그후 새우젓 장수는,
"새우 조~엇 사려!"
발음이 이상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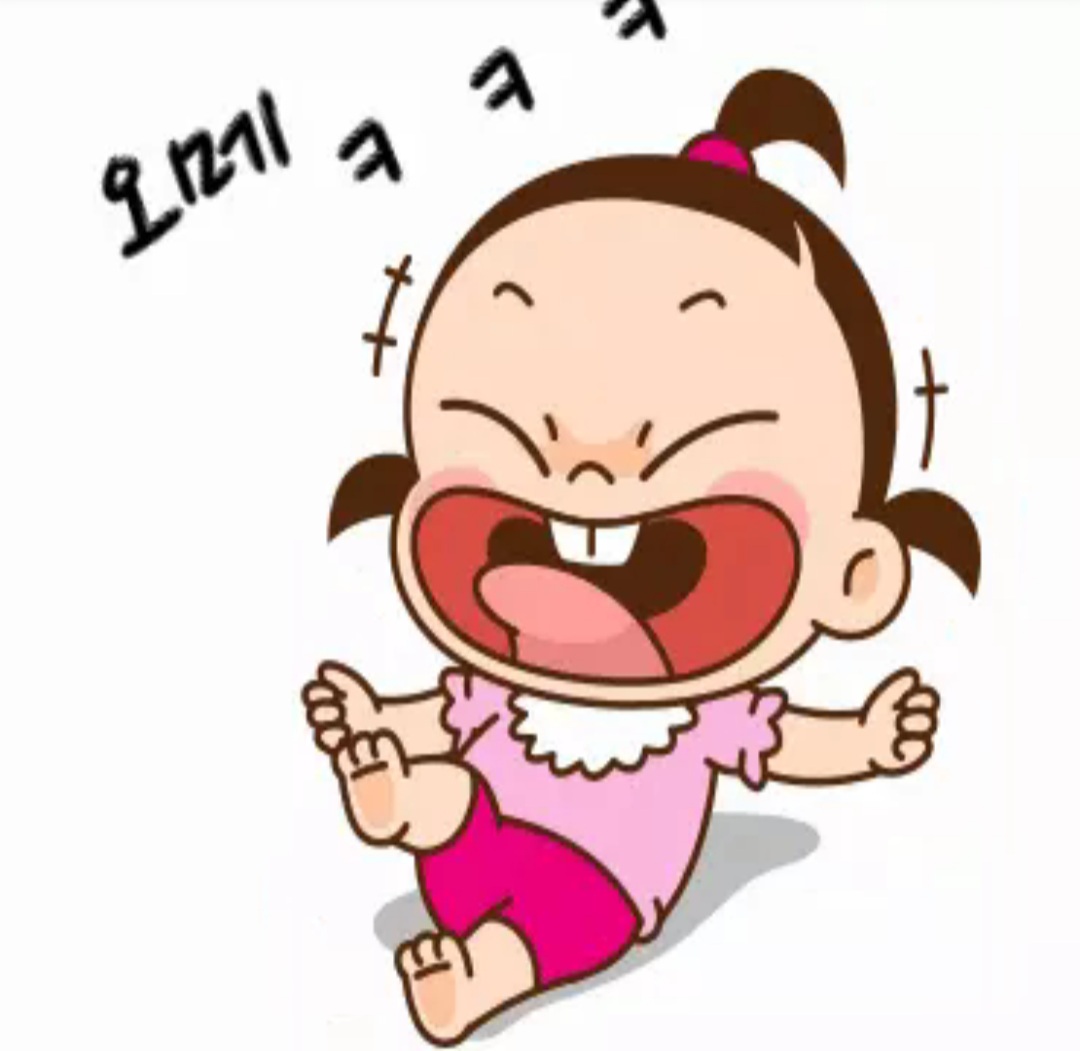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주자의 후회 10가지 ♣︎ (0) | 2021.04.20 |
|---|---|
| ★ 인생은 나를 찾아 가는 길 (0) | 2021.04.20 |
| 살면서 배울 인생의 지혜-- (0) | 2021.04.19 |
| 서울대병원 교수 5명이 추천하는 건강수칙 10가지 (0) | 2021.04.19 |
| ♥제대로 된 백세 건강법 (0) | 2021.04.19 |







